반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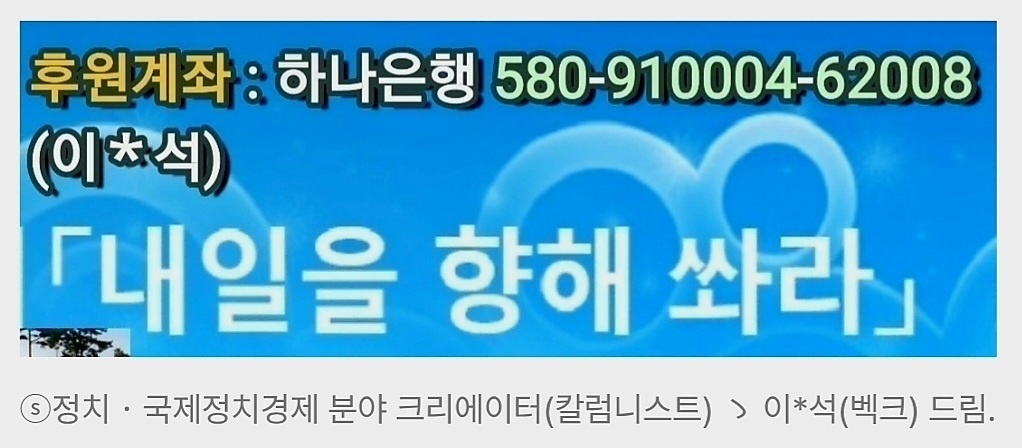
궁(窮)하면 통(通)한다 -- 정약용의 경우도, 베토벤의 경우도 그랬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 "궁하면 통한다."
매우 궁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펴나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정약용과 김정희는 귀양을 간 유배지에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고, 베토벤은 청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다.
이들은 삶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생의 소중한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꽃이 안 피지만, 뿌리 번식이 불가능해지면,
마지막으로 단 한번의 꽃을 피워 종자를 맺은 다음 말라 죽는다.
동양란은 물과 영양이 부족하면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소나무는 환경이 열악해지면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감지하는 순간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생존이 위태로워질 경우 사력을 다해 마지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신의 유전자와 삶의 흔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궁(窮)하면 통(通)한다."
이러한 현상을 '앙스트블뤼테(Angstblü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독일어로 두려움, 불안을 뜻하는 앙스트(Angst)와, 개화, 전성기를 뜻하는 블뤼테(Blüte)의 합성어로, '불안 속에 피는 꽃'으로 번역할 수 있다.
가장 정교하고 다양한 음색을 표현한다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비밀도, 앙스트블뤼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17세기 중반 유럽에서 지속된 이상기후 동안, 알프스산맥의 가문비나무는 생존을 위협받게 되자 극도로 성장을 멈춰 목재의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이탈리아의 악기 제작업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이들 가문비나무를 사용해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그것이 명품이 되었다.
동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회광반조
(廻光返照)도 앙스트블뤼테와 유사한 의미인데,
사람이 죽기직전에 잠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마지막 유언을 할수 있는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한 차례 밝게 불꽃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주역의 핵심사상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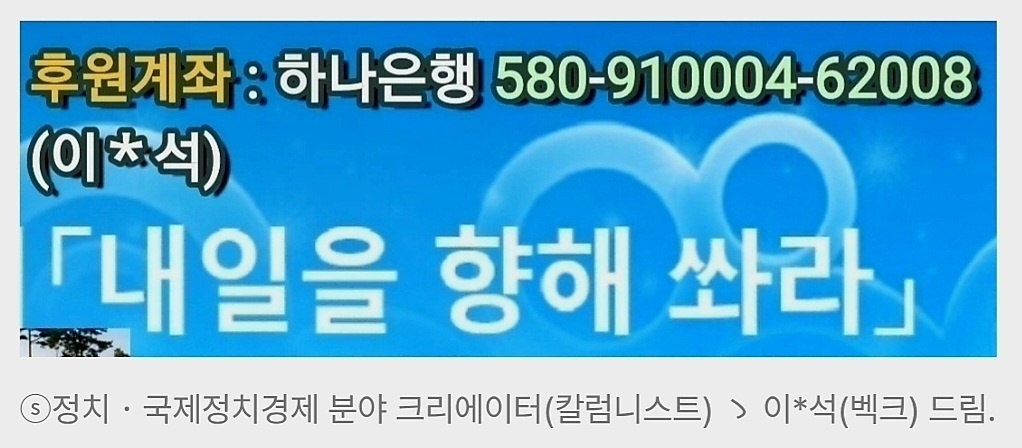
반응형
'이웃소식・이웃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봄날은 간다 Springtime goes (0) | 2025.05.15 |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는 국민의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심한 화상 입혔다 (4) | 2025.03.26 |
| 마(魔)의 삼각축 선관위-헌재-법원은 한국의 '트라이앵글 버뮤다'인가 !? (2) | 2025.03.12 |